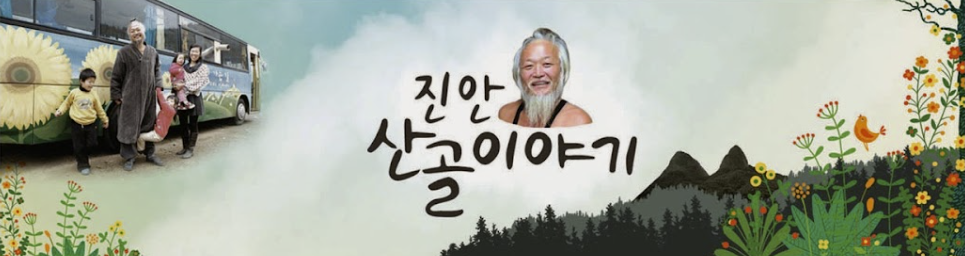호수 옆으로 새로 생긴 완만한 길을 타고 한참 내려오면 갑자기 넓은 들판이 펼쳐진다. 들판이 나타남과 동시에 완만히 뻗은 산자락 밑으로는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마을에는 거창신씨 집안과 관련된 문화재들이 많다. 물길을 곁에 두고 산 아래로 들어서면 울창한 대나무 숲이 보인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대숲 하나만 기지고 있으면 자식들 대학교육을 넉넉하게 시킬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쓰임이 없어져 대숲에 발을 들여놓기도 힘들게 생겼다.
예전에 대나무는 비닐하우스를 짓는데도 쓰이고 못자리를 내는 데도 썼다. 죽순은 인기 있는 식재료였고 대나무도 음식을 만드는데 썼다. 대나무를 갈라 집을 지을 때 벽을 만드는 재료로도 썼고 천정과 지붕을 만들 때에도 대나무를 썼다. 대나무 숲 주변으로 충효사와 죽산재가 있다.
충효사는 임진왜란 시기 의병장으로 활약하신 문열공 김천일과 선조 때 숙부 황윤길과 함께 일본에 다녀와서 왜란을 예언하신 무민공 황진과 임진왜란 당시 효행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는 미계 신의련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중종반정 이후 신의련의 할아버지 신인장은 식솔들을 이끌고 환란을 피해 노촌리로 들어오게 된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신순을 모시고 살던 신의련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식솔들을 피신시키고 병이 깊어 움직이지 못하는 아버지와 둘이서만 집에 남아 있다가 왜군과 마주하게 된다. 마을의 촌장이었던 신순을 왜군이 죽이려 하자 신의련은 몸으로 막아서며 아버지를 보호한다. 이에 감동한 왜장이 신의련의 효성을 시험하기 위해 혈서로 "효자 신의련"을 쓰게 한다. 신의련이 혈서를 써서 주자 왜장은 불을 피우고 종이를 불에 던졌지만 종이는 타고 글씨는 남아 하늘로 올라갔다.
왜장은 마을입구에 '효자가 살고 있으니 이곳은 해하지 말라'는 방을 붙이고 떠난다. 소문을 들은 지역 사람들은 노촌리 산과 계곡으로 모여들어 오만 명이 목숨을 부지했다고 한다. 그래서 생겨난 지명이 오만동이다. 데미샘 발원지 인근에 은거하며 살아가던 정씨 집안사람들의 삶이 조선 초기에 시작되었고 백운동계곡으로 이어지는 골짝 사람들의 삶이 동학농민혁명과 천주교박해와 관련이 있다면 신광재 아랫마을 사람들의 은둔은 중종반정과 임진왜란으로부터 기인했다.
충효사 옆에는 죽산재가 있다. 죽산재에서는 매년 대종중 시제를 모시지만 건축형태로 보아서는 처음부터 서당으로 쓰기위해 지은 건물이다. 죽산재 옆에는 충효사와 산을 관리하는 산지기가 살던 집이 있어 최근까지 죽산재는 관리가 잘 된 편이다. 거창신씨 종손의 막내따님의 증언에 의하면 죽산재에서는 방안과 마루와 마당에서도 멍석을 깔고 아이들이 공부를 했다고 한다. 충효사는 사당의 격식에 맞게 굵은 나무기둥에 솟을대문을 갖추고 맞배지붕위에 점판으로 된 돌너와를 올려 마무리했다.
죽산재는 시골 살림집 양식으로 지었고 지붕은 야트막한 우진각지붕 양식을 취했고 건축당시에는 돌너와를 얹었으나 지금은 가짜 슬레이트가 지붕을 덮고 있다. 그 흔하던 돌너와 지붕이 하나 둘 사라지고 가짜 슬레이트가 그 자리를 차지하자 돌을 다루던 기술자들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관리가 잘 된 돌너와 지붕을 보면 용의 비늘을 등에 이고 하늘을 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현재 돌너와로 지붕을 이고 있는 건물들은 문화재로 인정받아 관리가 되지만 돌너와를 다루는 기술자는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자칫하면 유형의 유산도 무형의 유산도 다 사라질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