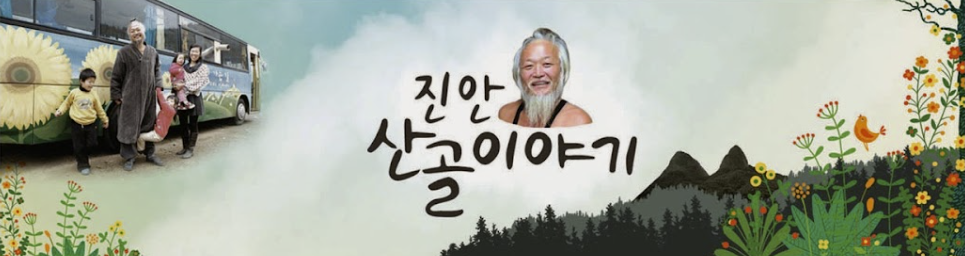용소폭포에서 몸을 던진 물은 고요하게 속삭이며 흐른다. 물소리가 고요해진 만큼 골짜기는 넓어지고 평평한 논과 밭이 나타난다. 숨어 살기에 넉넉한 호리병 모양의 마을이다. 들녘 사람들과 골짝 사람들과의 결계를 만들 듯 하미마을 입구는 좁은 협곡을 이루고 있다. 협곡 양쪽 산등성이로 올라 바위 몇 개만 굴려도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를 막을 수 있겠다.
호리병 안쪽에는 논과 밭이 넉넉하다. 공간이 품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한정되어 있지만 하미마을의 안전한 기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넉넉한 공간이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면서 좁은 공간이 되었다. 다행히 하미마을 사람들은 신광재를 넘어 장계장을 보러 다니면서 신광재 진달래평원에 희망을 심었다.
진달래평원을 개간하는 일은 소가 큰 일꾼으로 참여했다. 고맙게도 골짝 사람들의 보릿고개 사정을 알아채신 노촌리 촌장님께서 일소 세 마리를 내어주셔서 진달래평원을 개간하는 일은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봄에 일을 마친 소들은 늦가을에 송아지 네 마리를 낳았다. 하미마을 사람들은 빌려온 소들에게 정성을 다했고 건강하게 겨울을 난 소와 송아지는 다시 돌아온 봄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노촌리 촌장님은 어미소만 돌려받고 송아지는 하미, 비사랑, 상미마을 사람들에게 농사일을 돕도록 돌려보내셨다. 신광재 진달래평원을 개간하고 나서는 보릿고개가 사라지고 곡식이 남아돌아 장계장과 백운장으로 내려 보냈다. 들녘 사람들과 깊은 골짝 사람들의 다리 역할을 하던 하미마을도 한국전쟁이 끝나갈 무렵 토벌대에 의해 사라졌다가 제 자리를 찾아 돌아온 사람들로 다시 마을이 살아났다. 깊은 산골마을 치고는 제법 큰 마을을 이루었다.
하미, 비사랑, 상미 마을은 1980년 무렵에 전기가 들어올 정도로 외부세계와 단절되어 있어서 귀틀집과 너와집, 굴피집 등 전통가옥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외부 세계와의 단절이 주는 특혜는 약간의 불편함과 무한의 자유와 아름다움이었다. 벽체의 재료도 산중에서 구하기 쉬운 돌과 나무와 흙을 자유롭게 썼다.
들녘 사람들의 집들은 근대화라는 명목으로 오래된 생활문화유산들이 폐기되었지만 산중 사람들은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진 구들방과 너와지붕을 보존하며 살았다. 들녘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편했지만 골짝사람들은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돈을 벌어서 슬레이트지붕을 씌우는 일이 더 힘들었고 돈을 들여서 석유곤로를 사들이고 연탄을 사는 일이 더 힘들었다.
연탄아궁이를 놓았다 한들 연탄을 실어 나르는 일이 나무를 해서 때는 일보다 어려웠으리라. 사람들은 누구나 쉬운 생활방식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산중 사람들은 아궁이 하나로 방을 데우고 가마솥 하나로 음식을 만드는 일이 돈을 버는 일보다 훨씬 쉬운 일이었다. 손과 발이 수고롭고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하는 불편한 생활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산중 사람들의 삶은 생활에 편리한 새로운 물건을 들이지 않고도 건강하게 오래 지속되었다. 요즘 사람들에게 유행처럼 번지는 미니멀라이프를 골짝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실천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계시는 어르신들이 남아있다.
하미마을을 빠져나온 물은 곧바로 노촌저수지와 만난다. 비사랑 마을까지 전기가 들어가고 한참 세월이 흐른 2001년부터 물을 가두기 시작한 저수지다. 최근에 수위를 높이는 공사를 해서 저수지물이 하미마을 입구까지 찰랑거리게 되었다. 성수산과 덕태산이 내어주는 풍부한 물줄기는 노촌호수를 채우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호수 곁으로 만들어 놓은 도로를 따라 걷다보면 길가에 검정색 점판암들이 즐비하다. 도로를 내기 위해 절개해 놓은 산을 보면 온통 점판암층으로 이우어져있다.
점판암은 점토층이 열을 받아 돌로 변한 변성암인데 얇은 층으로 쉽게 떨어지고 물을 흡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수지 인근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돌너와로 지붕을 올렸다. 돌너와는 내구성이 좋아서 가끔씩 밀려 내려온 돌들만 손을 봐주면 영구적이었고 집을 무겁게 눌러주어 안정감도 좋았다. 사실 슬레이트라는 말은 얇게 떼어낸 점판암을 가리키는 말인데 유독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석면으로 만든 가짜 지붕소재를 슬레이트라 부른다. 아직 노촌리 일대에는 진짜 슬레이트를 이고 있는 돌너와 지붕이 남아 있지만 한때 편리함을 강요받은 대부분의 가정집들은 가짜가 진짜를 몰아내어 석면 슬레이트가 지붕을 덮었었다.
가짜가 진짜를 몰아내는 데는 정말이지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리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 시골에서 도시로 쫓겨난 사람들이 슬레이트 공장에서 시름시름 죽어 나가자 슬레이트 공장들은 문을 닫고 석면의 유해성을 모르는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겼다. 일본에서 문을 닫은 슬레이트 공장이 한국으로 오고 한국에서 문을 닫은 공장들은 동남아시아로 가고 과연 공장 주인들은 석면의 위험을 모르고 있었을까?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석면 공장에서 일을 하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힘겨운 삶을 이어가면서 공장 주인들과 오랜 시간 싸움을 했다. 공장 주인들은 노동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병이 생겼다고 주장을 했다. 방독면 수준의 방진 마스크를 써야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석면의 위해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옮겨 다니며 편리와 효율성을 과장하면서 돈을 벌었다. 동남아시아에도 석면슬레이트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석면슬레이트 공장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고 문을 닫았다. 하지만 석면슬레이트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 남아 고비용을 들여가며 철거를 하고 있다.
점판암이 만들어진 시기는 대략 2억 년 전인데 가짜슬레이트가 판을 치다가 사라져간 시간은 50년이 채 되지 않는다. 노촌호수 안쪽 사면에는 2억 년 전에 만들어진 진짜 슬레이트가 고작 20년 째 잠겨 있다. 석면슬레이트를 강요했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석면슬레이트를 강요받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으니 참 서글픈 일이다.
'사람의 기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거창신씨 집성촌 (34) | 2023.11.07 |
|---|---|
| 노촌리 방죽 (38) | 2023.11.07 |
| 백토가 나는 마을 (23) | 2023.11.07 |
| 신광재 고갯마루에서 물과 길은 시작되고 (29) | 2023.11.06 |
| 백운 매사냥은 자발적 사회복지 행사였다. (19) | 2023.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