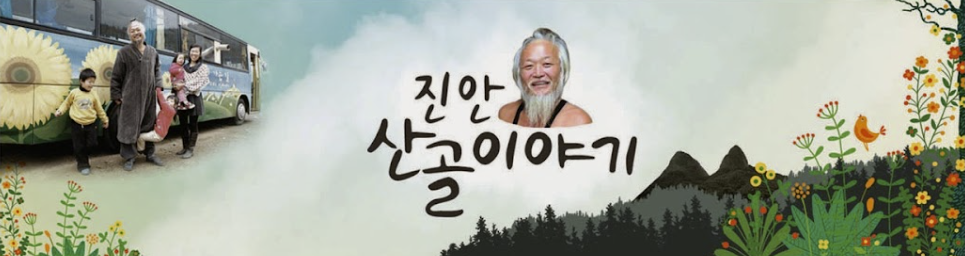임실에서 고개를 넘어 백운으로 들어오는 길목 동창리에는 500년을 살아온 느티나무가 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잠깐 쉬고 오른편으로 돌아 섬진강을 거슬러 오르면 장수읍으로 가는 길이 나온다. 느티나무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백운 장터가 나오고 장터를 지나 걸음을 재촉하면 마령면과 진안읍에 닿을 수 있다.
백운장터는 임실읍과 진안읍, 장수읍, 고원에 펼쳐진 평야를 품고 있는 마령면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발달할 수 있었고 흙과 나무와 물 등 자연환경이 공장들의 발달을 뒷받침해주었다. 하지만 생활문화의 급격한 변화는 오랜 세월을 이어온 백운 사람들의 삶을 요동치게 했다.
학생 수로 그 변화를 이야기하자면 1970년대 초반에 한 학년이 200명에 가깝던 중학생이 지금은 전교생이 12명이다. 몇 사람의 힘으로 거대한 역사와 문화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었겠지만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선택으로 작은 지역에서만이라도 수백 년 간 이어온 문화유산을 지키면서 느리고 불편하지만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 수도 있었을지 않을까? 어르신들 이야기를 듣다보니 아늑한 초가지붕이 보고 싶고, 거친 틈사이로 하늘이 올려다 보이는 너와지붕이 그립고, 묵직하게 지붕을 누르고 있는 돌너와의 무게를 느껴보고 싶어진다.
이야기 다섯 데미샘과 백운동계곡이 만나다.
천상으로 올라가는 봉우리 천상데미 아래 데미샘에서 출발해 고원의 고도를 달리던 물들은 성수산 남서쪽 사면이 내어준 물줄기와 모이고 선각산과 팔공산과 성수산이 뿜어내는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들어 내동산 앞을 지날 즈음에는 고원의 강을 이룬다. 고원의 강이 운교리에 닿으면 백운동계곡 깊은 물과 만나고 검은 모래를 실어 나르는 미재천과 만나 묵직한 힘으로 흐르는 강이 된다.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모이고 만나는 것은 이렇게 큰 힘이 된다. 여기에 당연히 있어야 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과 어울리는 물레방앗간이 있다.
기록에 의하면 1850년대 이전부터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의 건물이 그렇다는 것이지 또 다른 형태로는 훨씬 오래전부터 물레방아는 돌아갔을 것이다. 골짜기에 있는 문화유산과 기록들은 600년을 넘지 못하지만 섬진강이 들판을 만나는 마을들에는 선사시대 유적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농경사회가 시작되고 물을 이용하는 능력이 생기고 바퀴를 만들어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물레방아는 돌았을 것이다.
방앗간 곁에는 야트막한 둥근 산이 있다. 산 이름 또한 둥근 산이라는 뜻의 원산이다. 일제강점기에 한자어로 이름이 바뀌었겠지만 동네 어르신들은 몇 발짝 폴짝 뛰면 오를 수 있는 이 산을 '도르뫼', 또는 '도르메'라 부른다. 도르메는 물레방앗간보다 조금 높게 서서 방앗간을 감싸주고 있다. 도르메는 방앗간으로 들이닥치는 바람을 막아주기도 하고 옆구리로 물길을 내주어 물레방아로 떨어지는 물의 낙차를 만들어준다.
도르메와 물레방앗간은 그렇게 잘 어울려서 동네 사람들은 이 방앗간을 '도르메방앗간'이라 부른다. 도르메 뒤쪽 강에는 구수보, 확보, 삼굿보 등 여러 개의 작은 보들이 있다. 큰물이 져도 밀려나지 않도록 물살에 큰 거슬림이 없는 자연스러운 보를 놓았다. 강물을 꽉 막아 큰 보를 설치하면 물레방아의 동력이 되는 물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겠지만 물의 흐름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은 자연스럽지도 않을뿐더러 위험천만한 일이다. 도르메방앗간을 설계하신 분은 바람 한 점 거스르지 않는, 물의 흐름마저도 크게 거스르지 않는 자연의 일부처럼 방앗간을 여기에 놓았다.
어르신들 기억에 남아 있는 백운면의 물레방아는 10여 개나 된다. 하지만 일감이 점점 줄고 하천의 수위도 낮아지면서 물레방아가 멈추었다. 작은 물레방앗간이 멈추기만 하고 형체는 유지하고 있었다면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남았을 텐데 좀 아쉽다. 쓰임이 있을 때는 소중히 다루다가 쓰임을 다했다하여 버려지고 파괴되어 버리는 현실이 아프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작은 방앗간들이 문을 닫으면서 규모가 크고 수량이 풍부한 도르메방앗간으로 일감이 몰리면서 도르메 물레방아는 더 바쁘게 돌아갔다. 1970년대부터는 백운면에서 생산되는 모든 곡식들은 도르메방앗간으로 모였다. 물레방아로만으로는 밀려드는 일감을 소화하지 못하게 되어 발동기를 보조동력으로 이용하다가 현대식 전기모터까지 갖춘 방앗간으로 변해갔다. 일감이 적을 때는 물레방아로 방아를 찧고 곡식이 많이 들어오면 모터도 함께 돌렸다.
1990년대 이후에는 현대식 정미소들이 생기면서 일감이 줄어들어 도르메방앗간 물레방아도 멈추게 되었다. 다행이도 문화유산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2002년에 전라북도 민속자료 제36호로 지정되어 유지보수를 하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도르메물레방아는 지금도 수문을 열고 동력전달 장치만 연결하면 방아를 찧을 수 있다. 방앗간을 관리하고 있는 주인장은 가끔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수문을 살짝 열어두어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사람의 기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방앗간 어르신과 매사냥 (1) | 2023.11.06 |
|---|---|
| 도르메물레방앗간 이야기 (0) | 2023.11.05 |
| 백운장터에서 (14) | 2023.11.05 |
| 백운약방과 삼산옥 (0) | 2023.11.05 |
| 사기그릇공장과 초가지붕 (0) | 2023.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