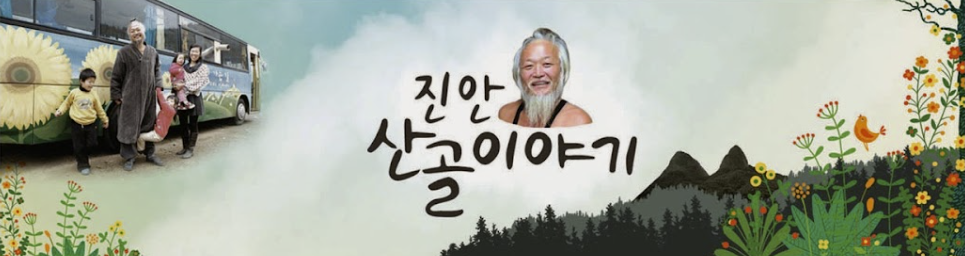기와공장이 있던 자리에서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조금 내려오면 백운 장터가 나온다. 장터 맞은편에는 평생을 한 자리에 살아오신 어르신이 운영하는 백운약방이 있다. 어르신은 1939년생으로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험한 세상을 소년과 청년으로 살아내신 아버지 세대와 배고픔에서 벗어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우리 세대를 이어주고 기억하는 고맙고도 중요한 분이다.
지금도 약방에는 비슷한 시대를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자주 찾아와 옛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웃음꽃을 피운다. 어르신들께 백운 장터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장터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장터를 현대화한다는 이유로 현대식 건물 몇 채가 들어서고 큰 주차장이 만들어지면서 장터의 흔적마저 사라져버렸다.
이제 백운 장터의 풍경은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게 되었다. 장터는 어르신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겠지만 백운장이 흥하던 시기와 쇠락해가는 과정과 사라져버린 풍경에 대한 기억은 우리네 삶의 문화와 역사를 기억하는 중요한 유산이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언제나 오류와 왜곡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어르신들께서는 서로의 기억을 고쳐주거나 맞장구를 쳐주면서 백운 장터의 풍경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풀어 주셨다. 약방에 모인 어르신들은 서너 살 터울이 지는 형 동생들이거나 친구들이다.
약방은 약국과 다르다. 시골마을에 의료시설이 없던 시기에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면 나라에서는 약방면허를 내주었다. 약방에서는 일상에서 자주 겪는 감기처럼 몸을 불편하게 하는 가벼운 증상에 대한 약을 취급한다. 백운약방 어르신은 학교를 다니던 청년시절을 빼고는 삶의 대부분을 장터에서 살아오셨다. 어느 시기에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문화처럼 약방도 어르신들의 시기에 생겼다가 세대가 지나면 사라져버릴 문화의 한 조각이다.
어르신들은 난로 주변에 모여 앉아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와 어린 시절의 기억을 오가며 추억 속으로 걸어 들어가신다.
약방 건너면 긴 건물은 모두가 양조장 건물이었지. 장터에 있는 건물 중에는 가장 컸어. 양조장은 우리 아버지들도 자주 들르던 곳이었으니까 언제부터 저기에서 막걸리를 만들었는지는 몰라. 가끔 주전자를 들고 아버지 심부름을 가서 보면 양조장 안쪽은 어둑어둑하고 시큼한 냄새가 풍기고 서늘하고 그랬어.
일하는 사람들도 여럿이 항상 있었고, 커다란 항아리가 여러 개 있었는데 늘 그 자리에 있었지. 장마당에서 놀다가도 보고 해질녘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보면 양조장에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어. 장터에서 가장 바쁜 집이었지. 양조장 앞에서는 시커먼 기와공장 아저씨들도 만나고 윗동네 아랫동네 친구들이며 아제들도 만날 수 있었어.
양조장을 끼고 골목을 지나면 장마당이 나오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또래 친구가 국밥을 팔았는데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는 문을 닫았어. 하여튼 국밥집 아궁이에는 불이 꺼지는 법이 없었어. 장사가 잘 되어서도 그랬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었으니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려면 국밥을 계속 끓이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었겠지. 아무튼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은 국밥집 할머니는 전쟁 중에도 국밥을 끓이셨어.
이 집 국밥은 인민군들도 먹고 국군들도 먹고 그랬지. 인민군들이 산에서 내려오면 장마당이나 학교 운동장에 모여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밥도 같이 먹었어. 세상물정 모르는 우리 꼬맹이들은 친절하고 재미있는 인민군 아저씨들이랑 노는 것이 좋았어.
인민군들은 산에서 놀러 내려온 사람들처럼 보였고 국군들은 화가 나서 싸우러 들어온 사람처럼 느껴졌어. 참 별 소리를 다 하네. 국밥집 옆에는 뭐든지 다 파는 잡화점이 있었어. 소금도 팔고 생선도 팔고 생활용품도 팔고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았어. 하도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팔다보니 일꾼들도 많았지. 사실 잡화점은 처음에는 생선장사로 시작했지. 산골에서 생선장사는 큰돈을 벌어주었어. 잡화점 옆에는 그릇을 전문으로 파는 가게가 있고 그 옆으로 곡식과 씨앗을 파는 가게가 있었지. 그리고 장날에만 백운에 들어오는 장사꾼을 위한 지붕과 칸막이로 이루어진 빈 공간이 열 두어 칸 있었지.
잡화점 어르신은 우리 아버지 세대 어르신 중에는 나이가 가장 많았는데 사업수완이 좋았고 돈 욕심도 많은 분이셨어. 백운에서 돈이 되는 사업은 대부분 잡화점 어르신과 관계가 있었지. 양조장은 큰아들이 운영했고 사기그릇공장은 작은아들이 가졌고 기와공장은 셋째가 잡화점의 일부는 넷째가 물려받았어. 큰아들은 양조장을 운영하면서도 정송마을에서 옹기공장도 돌렸지.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거치면서 다른 지역은 산림이 황폐화되었다지만 여기 무주, 진안, 장수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고 1970년대 즈음에는 벌목사업이 흥했는데 잡화점 어르신은 미군들이 남기고간 제무시트럭을 몇 대 굴리면서 벌목사업에 뛰어들었지. 물론 벌목사업도 성공적이어서 잡화점 집안사람들은 다들 부자로 잘 살았어. 양조장집 하면 사돈의 팔촌까지 잘 살았지. 지역에서 큰 부잣집에서나 하던 매사냥을 그 집안 먼 친척이 전수받았으니 말 다 했지.
뭐! 아마도 그 무렵이었을 거야. 양조장 옆 골목에 작은 막걸리집이 생겼지. 삼산옥이라는 간판을 달고 작게 시작했는데 금방 방이 여섯 개나 딸린 식당 겸 막걸리 집으로 커지더라고. 막걸리 집 누님이 우리보다 예닐곱 살 많았고 우리도 한참 막걸리를 먹으러 몰려다닐 때니까 대충 1968년 무렵이었어. 누님말씀으로는 하루에 말 통으로 17통정도 팔았다고 했으니 정말 대단했지.
막걸리 집 형님은 농사도 짓고 물고기도 잡고 짐승도 키우면서 음식재료를 준비했어. 내동산과 팔공산에는 금광이 있었고 운교리에는 주물공장이 돌아갔고 면소재지에는 기와공장에 사기그릇공장에도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보니 분교를 포함하면 초등학교만 해도 다섯 개나 있었어. 그때는 선생님들도 관사나 동네에 살았지.
밤이면 선생님들이 학부모와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술도 많이 마셨지. 삼산옥 누님네는 부부금슬도 좋아서 4남 1녀를 두었지. 그렇게 잘 사시다가 자식들이 다들 도시로 떠나보내고 형님이 먼저 돌아가셨지. 그게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야. 누님은 백운 장터가 시들해지고 나서도 동생뻘 되는 우리들하고 아들 나이 또래 청년들까지 챙겨가면서 식당을 지키시다가 몇 해 전에 돌아가셨지. 뭐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하게 되네. 삼산옥 누님과 우리들처럼 장터 사람들은 50여년을 그렇게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왔어. 물론 다투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부러워도 하고 고마워도 하면서 살아왔는데 많이들 먼 곳으로 돌아가고 나니 아쉬움만 남더라고.
'사람의 기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백운동계곡과 섬진강이 만나다. (0) | 2023.11.05 |
|---|---|
| 백운장터에서 (14) | 2023.11.05 |
| 사기그릇공장과 초가지붕 (0) | 2023.11.05 |
| 이야기 넷 백운동계곡에서 1편 (12) | 2023.11.05 |
| 이야기 셋 자기 굽는 마을 (24) | 2023.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