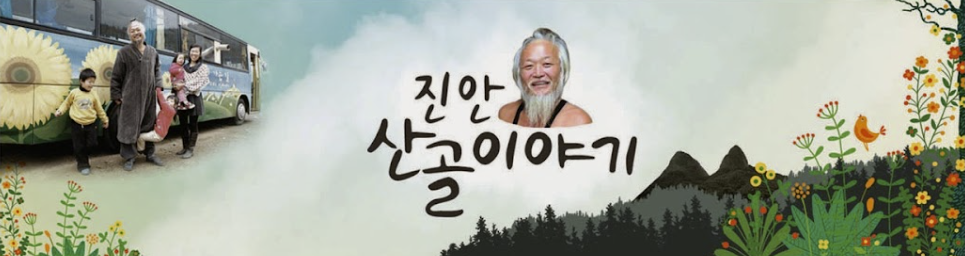이야기 넷 백운동계곡에서
백운동 계곡을 품고 있는 덕태산은 특이하게도 남쪽으로 뻗은 사면만 완만하고 느리고 길다. 덕태산은 봉우리가 덕스럽게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지만 덕태산은 다양한 약초와 풍부한 물과 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다. 산의 대부분은 참나무와 활엽수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참나무 숲이 끝나면 더 완만해진 산에는 아름드리 잣나무가 커다란 숲을 이루고 있다. 잣나무 숲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작은 돌들로 쌓은 작은 논과 밭의 흔적이 보이고 가끔은 머지않은 과거에 마을이 있었을법한 넓고 평평한 터도 보인다. 계곡 건너편에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있는 듯 없는 듯 쓰러져가는 오두막이 보인다.
솔정지 소나무가 있는 곳 까지 백운동 계곡은 조용히 흐른다. 계곡물이 느리게 흐르는 만큼 산은 완만하고 농사를 지을 만한 평지가 제법 많다. 백운동 사람들은 정자를 정지라 불렀고 솔정지 소나무는 소나무 정자를 뜻한다. 솔정지 소나무는 백운동에 은거하던 사람들과 백운동 아랫마을 사람들의 경계이면서 소통의 공간이었다.
아랫마을 사람들은 솔정지 아래에서 백운동 사람들을 만나 세상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서로 필용한 물건들을 바꾸기도 했다. 마을에 기쁜 일이 생기거나 흉한 일이 생기면 백운동 사람들은 솔정지로 내려오고 아랫마을 사람들은 솔정지로 올라와 공동으로 제사를 지냈다. 300년 넘는 세월을 그렇게 살아온 소나무는 백운동 사람들이 토벌대에게 쫓겨 아랫마을로 내려오면서 생기를 잃어가다가 몇 년 전에 그리운 곳으로 돌아갔다. 사람과 교감하며 살아온 나무는 교감이 단절되면 교감하던 사람들을 따라 돌아가는 것일까? 백운동 사람들이 언제부터 여기에 은거를 시작했는지는 무슨 이유로 깊은 골짜기에 숨어 살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존재했던 기억과 흔적은 백운동 여기저기에 남아있다.
백운동 계곡 물은 솔정지 소나무를 지나면서 속도를 내다가 점전바위를 타고 낙하한다. 칼로 자른 무의 단면처럼 깔끔하게 수직을 이룬 점전바위는 바위 밑으로 깊은 동굴을 가지고 있다. 높은 바위에서 뛰어내린 물은 바위 아래에 깊이를 알 수 없는 시커먼 소를 만들었다. 그리 넓지 않은 소지만 바위 밑으로 이어지는 동굴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다. 경외심을 일으키는 물은 깊이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품고 있다.
점전바위 아래에는 천년을 살아온 이무기가 있었다. 이무기는 둥근달이 환하게 검은 하늘을 비추던 어느 날 용이 되어 하늘로 날아올랐다. 이른 새벽 볼 일이 있어 밖에 나온 처녀는 용으로 변해가는 이무기를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른다. 그 소리에 놀란 용은 다시 이무기가 되어 바위 아래 물속으로 숨어버린다. 그 모습을 본 처녀는 미안한 마음에 바위 아래에서 이무기가 용으로 승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0일 동안 치성을 드린다. 처녀의 정성에 감동한 하늘은 이무기의 승천을 허락하고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른 이무기는 처녀에게 큰 복을 내려 자자손손 부자로 건강하게 살도록 해주었다는 이야기다.
언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이 이야기는 보통의 이무기 이야기와 좀 많이 다르다. 보통 이무기 이야기에서 처녀는 제물로 바쳐지거나 부정을 타는 등장인물로 나온다. 또 이무기는 승천을 하지 못하고 물속에 가라앉아 저주를 품고 다시 천 년을 살면서 사람들을 잡아간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점전바위 이야기는 정 반대로 결말이 난다. 처녀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고 이무기는 앙갚음이 아닌 은혜를 갚는 영물로 바뀐다.
기존의 이야기들은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 접근을 막거나 저주를 품은 이무기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야하는 구실로 이용된다. 백운동에 은거하며 살던 사람들은 들판 사람들과 생각이 좀 달랐다. 아마도 백운동 사람들은 들판 사람들과의 적당한 거리와 경계를 두고 싶었나보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도 말고 설령 보았으면 정성을 다해 기억을 지우면 복이 찾아올 것이라는 메시지로 읽히는 이야기다. 그렇게 백운동 사람들과 들녘 사람들은 적당한 경계와 거리를 두고 몇 백 년을 살아왔다. 일제강점기의 광폭한 시절도 견디어온 사람들은 한국전쟁의 포화에 쓰러지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뿔뿔이 흩어져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다.
점전바위에서 떨어진 물은 잠시 빠르게 흐르다가 고요해진다. 옛날에는 다랑이 논이었을 밭으로는 돌과 흙을 쌓아 만든 수로의 흔적이 계곡에서부터 뻗어있다. 백운동계곡물이 상백암 마을에 이르면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들어 수량이 풍부해지고 논과 밭들도 규모가 커진다. 중백암 마을부터는 너른 들판이 펼쳐진다.
중백암 삼거리 냇가에 있는 정자 옆에는 1970년대 초까지 방아를 찧던 물레방앗간이 있었다. 물레방앗간이 있던 곳에는 어김없이 정자가 들어서 있다. 정자와 물레방아는 잘 어울리는 한 쌍의 기러기를 닮았다. 사람들이 경계를 지켜야할 만한 곳에는 정자가 있었고 길과 길이 만나는 삼거리에도 정자가 있었다. 옛날보다 오히려 인구가 줄어버린 산골마을의 정자는 도시 사람들의 피서지로 쓰이고 있으니 다행이다.
기계식 정미소가 생기면서 쓰임을 다한 물레방아는 돌기를 멈추었고 멈춘 물레방아는 지각없는 사람들에 의해 철거되었다. 쓰임이 사라지면 외면당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되돌릴 수 없는 폭력은 좀 너무했다. 사물에 그런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은 쓰임이 적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부족한 것은 부족한대로 보고 느리면 느린 대로 물레방아를 돌렸다면 지금쯤 아름다운 문화유산으로 남았을 것이다.
1960대 청년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을 보면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니다. 상백과 중백, 백운동 사람들이 키운 곡식은 여기에 모였다가 제 자리로 돌아갔다. 물은 흐르고 흐르면서 이야기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으기도 흩어지게도 하고 경계를 짓기도 한다.
'사람의 기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백운약방과 삼산옥 (0) | 2023.11.05 |
|---|---|
| 사기그릇공장과 초가지붕 (0) | 2023.11.05 |
| 이야기 셋 자기 굽는 마을 (24) | 2023.11.04 |
| 이야기 둘 만육 최양선생 돈적소에서 내린 물 (14) | 2023.11.04 |
| 이야기 하나 데미샘 (23) | 2023.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