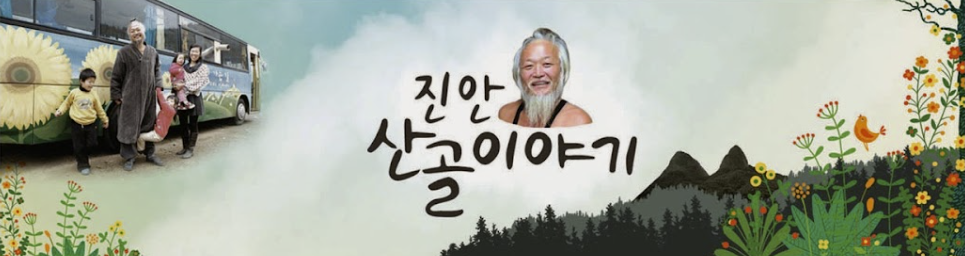이야기 여섯 방앗간 어르신과 매사냥
가을이 오면 백운의 하늘에는 차가운 창공을 날던 까마귀 떼가 날아든다. 그 위로는 매가 돌아오고 더 높은 하늘에는 검은독수리 무리가 하늘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까마귀들은 잠시 머물며 논밭에 남겨진 곡식들을 주워 먹고 바다를 건너지만 매와 독수리는 백운을 고향으로 생각하는지 야트막한 산등성이 가장 높은 나무에 앉아 백운 들판을 내려다본다. 매의 눈은 천리를 본다고 했다. 백운에 들어온 매들은 골짜기마다 숨어 사는 은자들의 삶에서부터 들사람들의 내밀한 삶까지를 내려다보며 겨울을 난다.
가을걷이가 끝나고 바쁘게 돌아가던 방앗간 일이 한산해지면 방앗간 어르신은 매사냥을 준비한다. 매사냥 준비의 하늘로부터 매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매사냥의 때가 되었다는 것은 동네 꼬맹이들이 제일 먼저 안다. 아이들은 서너 명이 짝을 지어 들판으로 야산으로 매가 먹다 남긴 비둘기나 꿩을 찾으러 나선다.
매가 사냥한 흔적을 찾은 아이들은 방앗간으로 달려간다. 매가 사냥한 흔적을 알아온 아이들에게 방앗간 어르신은 닭을 한 마리씩 상으로 주었다. 매는 먹이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먹다 남긴 먹이를 먹으로 반드시 다시 찾아온다. 특히나 매는 산비둘기를 무척이나 좋아한다. 시력이 좋은 매가 천리를 본다면 비둘기는 만리를 보고 나는 속도도 빨라 비둘기가 매의 존재를 눈치 채면 사냥이 불가능하다.
매들은 비둘기의 능력이 부러웠는지 유독 멧비둘기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 그래서 매가 먹다 남긴 비둘기를 발견하는 것은 매를 받는 과정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다. 방앗간 어르신은 매사냥을 위해서 또는 아이들에게 꿈을 나눠주고 싶어서 봄부터 닭을 늘려놓았다. 사냥에 필요한 매는 한 마리이지만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 매의 흔적을 알려오는 아이들에게는 기쁜 마음으로 암탉을 내주었다.
아이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마음을 가지게 하려는 어르신의 세심한 베려는 아이들의 부모들에게도 전해졌다. 매가 먹다 남긴 비둘기 주변으로 명주실로 짠 그물을 설치한다. 매를 받는 방법으로는 매덫을 설치하거나 올무를 놓기도 하지만 매가 날개를 다치거나 놀라서 사람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방앗간 어르신은 가장 안전한 방법인 매그물을 설치하고 기다리는 방법을 선택한다. 매를 기다리는 시간은 경건하게 보내야한다.
그물을 설치한 곳 근처 나무 밑에 나뭇가지와 풀로 얼기설기 움막을 짓는다. 움막을 짓기 전에는 몸을 정갈히 하고 하늘에 제사를 올렸다. 방앗간 어르신은 매를 사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늘의 정령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매를 잡는 행위를 하늘이 내려준 매를 받는다 생각했다. 방앗간 어르신은 매를 이용해 사냥을 즐기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는 매꾼이라 부르지만 봉받이라는 말을 좋아했다. 봉황만큼이나 귀한 하늘의 정령을 받아서 서로 교감하는 시간이 매사냥으로 사냥감을 잡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경험이었다. 경건한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하늘의 정령은 조용히 내려와 봉받이의 품에 안긴다.
'사람의 기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매사냥을 나가다. (0) | 2023.11.06 |
|---|---|
| 매 길들이기는 이렇게 (0) | 2023.11.06 |
| 도르메물레방앗간 이야기 (0) | 2023.11.05 |
| 백운동계곡과 섬진강이 만나다. (0) | 2023.11.05 |
| 백운장터에서 (14) | 2023.11.05 |